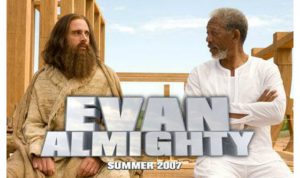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봤다. 농촌에서 서울로 상경했던 내 생활이 오버랩 되어 감성 충만하여 영화를 봤던 것 같다.
내가 자란 동네는 깡촌 정도는 아니지만 시골 냄새 풍기 던 곳이다. 어렸을 적엔 집이 어려워져 당시에 주변 사람들도 별로 겪지 않던 아궁이에 불 때며 지내는 곳에 살았다.
어렸을 적 추억들을 회상하면 마루바닥에서 수박을 먹던 것, 엄마가 가루를 물에타서 만드는 음료를 냉동실에 얼려 만든 아이스크림, 요강이라고 부르는 그릇에 소변 보던 것이나 안방이 아닌 신발 끌고 마당을 걸어 가야 했던 건너방에서 외할머니와 동생과 셋이 누워, 잠 들기전에 할머니가 해주던 옛날 이야기들이 생각난다.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건 대학생이 될 무렵이다. 내가 대학생일 때엔 2005년대 이므로 시골과 서울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다. TV를 통해 서울이 어떤 곳이구나. 라고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서울과 생활로 접한 서울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막상 올라왔던 서울에 놀랐던 것은 출근 시간 줄을 지어 지나가는 무수한 인파였다. 많은 군중이 이동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 벽으로 조심스레 걸었던 생각이 난다.
대학 생활 5~7년, 직장 생활 2~4년 동안 서울 또는 서울 인근에서 지냈음에도 서울은 내게 타지로 느껴진다. 매일 학교 또는 집, 회사 또는 집을 반복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고시원 생활과 원룸 생활을 전전 하다 보니 집이라는 나만의 공간에 내가 뿌리 내릴 곳은 마련하지 못 했다. 늘 ‘조금 있으면 옮길 건데.’ 라며 흔한 가구 하나 놓지 않고 이불 몇장 겹쳐 자고는 했다.
나는 참 묘하게 시골에서 자랐음에도 시골 생활도 잘 모른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도 투정 투성이라, 특히 사춘기에 심했는데 아버지가 밭에서 농사일 좀 도우라거나 동네 놀러가자고 해도 밖에 나가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시골 출신인데 시골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지냈는데도 서울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리틀 포레스트>를 보며 별거 아닌 장면인데도 갑작스레 눈물이 그렁그렁 해졌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 그곳엔 있었다. 내가 나로 자라왔던 시간들이 영화 속에 펼쳐지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던 것 같다.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내가 시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범하니 심심했던 옛 추억을 다소 보정한 것은 아닐까? 요즘엔 고향이라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집값이 많이 올라 ‘내고향’ 이라고 부를만한 곳은 부모님 세대가 유지했던 곳 뿐이다. 내 세대에도 ‘고향’이라고 부를만한 곳을 유지할 수 있을까?
뿌리라는 것은 안정감을 준다. 흙과 엉겨 붙은 장소엔 나를 돌아보는 추억이 있고 내가 나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가 있다. ‘고향’ 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쉴 수 있는 ‘리틀 포레스트’인 것 같다.
영화를 보며 그렇다면 ‘현대엔 어떤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야 할까?’, ‘조직이라는 곳은 내 의사를 절대 반영할 수 없는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생활’이라 불리는 ‘도시생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차갑기만 한 곳일까? 영화에서 단편적으로 표현한 ‘도시생활’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에 찬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시생활’은 차갑고 정 없기만 한 곳일까.
그동안 짧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속된 말로 잠깐 잠깐 빡치는 상황들도 있고 즐거운 적도 있다. 빡치는 상황들은 잘 어우러지지 않았던 인간 관계라던가 부담스러운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들에서 발생했다. 즐거운 상황들은 팀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결해가며 느꼈던 감정들, 바쁜 상황에서도 서로 잠깐씩 웃을 수 있던 여유였던 것 같다.
조직이라는 곳은 사실 쉽지 않은 모임이다. 서로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영역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이익 또는 목표로 인해 모인 것이다. 때문에 내가 평생 만날 수 없던 사람들과 만나기도 한다. 이런면에서 보자면 소중한 만남이고 배움이다. 다만,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 기업이라는 특별한 ‘자아’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게 두질 않는 것 같다. 기업 그 자체가 ‘자아’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는 독립될 수 없는 필연적인 아이러니 때문일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주도하는 누군가의 의지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감사하면서도 불만이 솟아오르는 나를 보며 ‘왜 이럴 수 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똑같은 불만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반항심일까?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묘사된 ‘도시생활’이라는 것에 대해 이유 모를 반발감이 들기도 했다.
영화 끝에 ‘아주심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주인공인 혜원은 서울 또는 시골에 아주심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갈 곳에 ‘아주심기’가 되긴 어렵다. 직면한 문제와 부딪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혜원의 ‘아주심기’를 현대의 청년들도 자신만의 ‘아주심기’로 따라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며 힐링이 되는 한편 ‘리틀 포레스트’ 조차 사치일 수 있는 현재가 다소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리가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https://youtu.be/i2xEcxNdX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