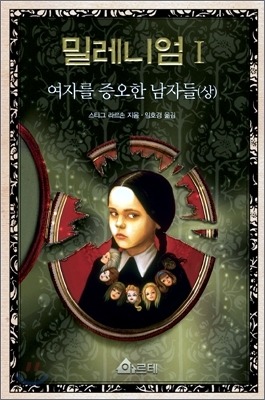
‘밀레니엄’은 “책에 빠져든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떠올리게한 책이다.
책의 뒷면에는 보통 그 책을 높히 평가하는 말들이 늘어서 있다. 물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밀레니엄도 마찬가진데 뒷면의 소개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일요일날 읽지 마라.”
내용의 요지는 일요일에 책을 읽게 되면 뜬 눈으로 월요일의 새벽빛을 보게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보고 피식 웃었다.
처음에 밀레니엄이 추리소설인지 모르고 집었었는데, ‘뭐 재밌는 소설이래 봤자 설마 밤을 새서 읽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무색하게 나는 이틀밤을 샜다.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책이 상,하 권으로 이루어져 ‘상’ 하룻밤, ‘하’ 하룻밤, 이렇게 이틀 밤을 샌것이다.
실로 밀레니엄의 흡입력은 대단했다. 정신이 산만한 필자는 쉽게 책에 빠져들지 못하는데 밀레니엄 만큼은 그 흡입력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책을 중간 중간 끊어 읽어도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계속 책 속에 빠져든 것이다.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떤 짜릿함이나 결정적 반전에서 오는 매력은 없었다. 다만,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과 범인을 추적하면서 주인공에게 닥쳐오는 위기들로 인해 나 또한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듯한 느낌 그러한 스릴이 독자로 하여금 이 책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추리소설을 보면, 대부분의 독자는 짜릿한 반전을 기대하게 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에서 오는 충격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필자는 밀레니엄에서 그러한 반전에서 오는 쾌감은 느끼지 못했다. 뭔가 덤덤했다고 할까? 물론, 범인을 알게되는 과정은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 도 있겠다. 하지만, 그리 큰 반전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이유라고 한다면, 독자에게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을 제공해 주지 않았던 탓이지 않을까?
주인공은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서를 얻게 된다. 이러한 단서는 물론, 독자에게도 제공되는 단서이다. 독자는 그 단서를 보고 범인을 유추해 보려고 한다. 밀레니엄에서도 이러한 단서를 잡게 되는데, 이 단서가 독자로서는 전혀 유추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고 본다.
범인을 유추하는 과정을 독자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밝혀 졌을때 반전의 효과를 보지 못한게 아닐까 한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책이 재밌다고 느껴졌다. 반전의 짜릿함도 없었는데 말이다. 앞서 언급했던 현실감도 한몫을 했겠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밀레니엄 속에선 여러 인물이 묘사된다. 상상력이 부족한 필자는 캐릭터의 생김새들은 머리속에 떠올리진 못했다. 다만, 그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그 인물들을 상상해가는데 저자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이 정말 감칠맛 나는 캐릭터들이었다. 주인공 급에 해당하는 두 인물, 미카엘 블롬크비스트과 리스베트 살란데르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 주변인물들도 매우 매력적이었다.
필자가 남자이므로 특별히, 여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에 대해 언급하자면, 약간의 광기와 약간의 새침함과 약간의 여성스러움. 이 희안한 조합들이 그녀안에 모두 내재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살란데르는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행동들을 볼 때 피식 웃음 짓게 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밀레니엄이란 책의 마력을 느낄 수 있는게 아닐까?
더운 여름날, 뜨뜨 미지근한 소설은 잠시 미뤄두고 싶다면 ‘밀레니엄’ 시리즈를 읽어 보심이 어떨까?
